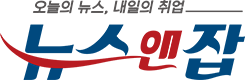국내의 한 벤처기업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며 매출이 1/10로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설계 별도, 생산은 위탁) 관련 133조원 투자 발표에 지난 4월 정부도 적극지원 하겠다고 했지만, 투자 진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 관계자는 제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장비가공제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완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한 기업은 국산화를 해도 납품할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력이 있어도 품질관리와 양산 시스템의 문제를 빌미로 납품이 불가하다.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국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우수성에 대한 브랜딩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뜨겁다. 벤처기업협회가 335개 기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벤처기업의 80%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응답기업 총 335개사 중, 7월초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관련 기업은 14개사, 화이트리스트 추가 제외로 인한 관련 기업은 48개사, 향후 타 국가로 무역규제가 확대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3개사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기업이 감내가 가능한 최대 기간은 평균 6~8개월로 응답했다.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32~38%)가 가장 많았고, ‘신제품 개발’(24~2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21~24%), ‘긴축 재정’(4.2~4.8%) 순이며, ‘없다’(8.5~9.5%)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으로는 ‘제조 및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지원 및 R&D지원’(70~7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영안정자금 및 세제징수 유예 등 지원’(16%), ‘수출입 제품 및 기술 인증 관련 규제 개선’(4~13%)이 뒤를 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적인 규제 확대가 예상되는 소재분야의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 ‘3~4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42.9%), ‘1~2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35.7%), ‘5~10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14.3%) 순으로 응답하여 벤처기업 스스로 기술의 우수성 및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다양한 요청사항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그중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꼽힌 것은 기존의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에게 위기임이 분명하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기술력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핵심소재 국산화를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