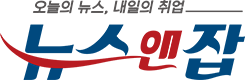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 1년간 25% 넘게 증가했다. 일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이런 추세를 주도했다.
2일 한국은행은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를 발표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작년 3분기 33만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000명으로 25.4% 증가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최근 쉬었음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 자발적 쉬었음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 쉬었음’도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비자발적 쉬었음 인구는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의 경력직 및 수시 채용 선호 등 구조적 요인 외에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임시직 계약 종료 등의 경기적 요인도 증가했다. 비자발적 사유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주로 중소기업,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나타난 청년층 쉬었음 증가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작년 3분기 33만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000명으로 지난 1년간 25.4% 증가했다. 이중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 쉬었음의 기여율은 각각 28.2%, 71.8%다.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하거나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무직자)화 될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층 ‘단기 쉬었음’ 증가는 ‘장기 쉬었음’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실제 취업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나, 1년이 지날 경우 해당 수치는 50% 내외로 하락한다. 이로 인해 쉬었음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할 확률(5.6%)은 실업 상태(26.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수민 한국은행 과장은 “청년층 쉬었음 증가는 향후 노동공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