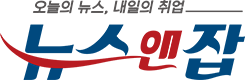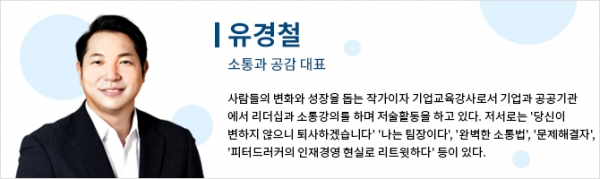
부서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정량화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모든 업무를 정량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실제 사례 연구>
“저는 제 업무의 정량화가 가장 어려워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KPI지표를 정량화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 업무 중에는 반드시 수치로 할 수 없는 것도 많거든요.”
개별 목표 수립 미팅을 매년 2월경에 실시합니다. 보통 개별 목표 수립한 내용을 팀 미팅을 통해 공유하고 피드백하는데, 공통으로 팀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업적 결과에 대한 정량화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팀장인 나로서도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정성화된 평가 지표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정성적인 결과물들을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까지 만들어 낼지가 고민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정한 원칙이니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회의를 이끌었지만, 팀장 또한 정량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 나중에 평가할 때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제를 정량화할 수만 있다면 정말 평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김 대리가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평가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는 평가는 팀장의 고유 권한이니 그냥 따르라고 하여 설득하였는데, (설득이 제대로는 안 되었겠지만) 올해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정량화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정량화가 아니라, 납득입니다.
“모든 것은 숫자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치로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표는 곧 수치’라는 표현에 길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적 지표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 설정이나 결과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량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납득’입니다. 물론 정량적 지표들이 납득하는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표는 측정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즉 활동의 핵심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핵심을 정량화하기 어려우면 정성적 지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우수, 양호, 미흡, 매우 미흡 등의 기대 이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학원 등록, 주행 시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KPI는 학원 등록이 아니라, 2종 운전 면허를 12월까지 취득한다가 KPI가 되어야 합니다.
팀원들과도 면담할 때도 팀장이 먼저 제시하지 말고 반드시 팀원들이 먼저 제시하게끔 하고, 서로의 기대 수준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량화라는 것은 고민하여 구체화하고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팀원들은 과제를 KPI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은 KPI가 아니라 해야 할 과제이고, 우측이 좌측 과제의 최종 아웃풋인 K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KPI를 선정할 때 팀원들에게 이런 고민을 먼저 주문하고, 그 결과를 팀장하고 합의하면 좀 더 정량화에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