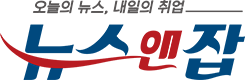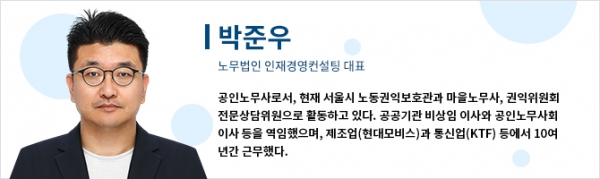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올해 7월이면 4년이 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부담과 함께 예방교육 실시 등 대비를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을 둘러싸고 혼선과 혼란, 갈등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비영리단체임을 내세운 노동운동 단체에서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의 상담사례나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언론은 이를 확대재상산하기까지 한다.
여기에 ‘괴롭힘’과 유사한 개념들인 갑질, 무례함, 불편함, 불쾌함 등이 괴롭힘과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혼돈이 더해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법적 개념인 ‘직장내 괴롭힘’이 무차별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이 직장내 괴롭힘을 다른 개념들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넓은 개념이 불편함이다. 불편함은 법률적 개념은 아니다. 부하직원들 입장에서 상사는 불편하다. 그 상사가 좋은 상사이건 안좋은 상사이건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한다. 기업 등 조직에서의 불편함은 업무적인 부분과 관계적 부분에서 각각 나타난다.
업무적인 부분의 불편함은 업무처리 방식, 의사결정 방향, 업무 우선순위 등의 차이에서 오는 업무 비효율화와 심리적 불편함이 있으며,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은 성향의 차이, 태도의 차이, 가치의 차이 등 각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한다.
즉, 불편함은 업무나 개인의 차이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것이다. 당연히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면 불편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함이 곧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신청을 하면서 휴가 사유를 관리자가 물으면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내 휴가를 내맘대로도 못쓴다거나 휴가사용하면서 눈치보인다고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휴가 사유를 묻는 것은 불편함을 주기는 하지만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다.
불편함이 좀 더 심해지면 불쾌함이 들게 된다. 부하직원 입장에서 상사의 무례한 행동이나 언어 등이 주는 불쾌함이 있다. 무례함은 말 그대로 예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는 예의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갖춰야 할 기본으로 볼 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의의 사전적 정의는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이다. 이를 비즈니스 용어로 치환하면 에티켓이 된다. 에티켓을 우리말로는 직장 예절이라고 한다.
즉, 예의는 직장 예절인 것이다. 무례하다는 것은 결국 직장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 예절을 지켜야하는 데에는 직급도 직책도 연령도 성별도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사도 부하직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상사의 무례한 언행은 부하직원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일에 대한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창의적 아이디어 고민하는데 신경쓰지 못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무례한 행동으로는 공지한 회의시간보다 항상 2~30분 늦게 나타나거나 회의 공지 자체를 잊어버려서, 직원들이 찾으러 가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회의 도중에 핸드폰을 카톡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통화를 하는 것과 함께 아무 의견이나 편하게 말하라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인상 쓰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무례함이 지나치면 부하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불쾌감은 자칫 잘못하면 부하직원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 부끄러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불쾌감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 등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 직장내 괴롭힘은 그렇지 않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관계나 지위의 우위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적정범위 여부다. 즉,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면 다소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갑질이라는 개념은 직장내 괴롭힘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갑질에 대해 대법원은 “그 자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이런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갑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갑질이 곧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업무의 적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냐 여부다.
상사가 부하직원보다 위에 있다는 점에서 ‘갑’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사의 지시와 행동, 말이 다 갑질은 아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갑질이 된다. 괴롭힘은 차별이 더 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게만 행해지는 언행이 그것이다. 유독 특정인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업무상 적정성 내지 적정범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부하직원인 근로자가 입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업무환경 악화 등과 비교가 필요하다. 아무리 관리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게된 고통 등이 더 크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하직원의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여 모욕감을 주는 것은 부하직원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흔히, ‘따끔하게 혼을 내야 정신 차린다’고 하면서 공개적 질책을 선호하는 관리자도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일방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위험한 행동이다.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업무상 적정성은 관리자의 부하직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하직원이 입게 될 고통과 비교하여 고통이 더 크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부하직원들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역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공개적 질책이나 모욕적 언사 등이 효과적인 관리방법이었을 수도 있으나, 그 방법이 지나쳐 부하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이전에 잘못된 관리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