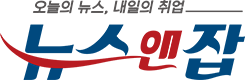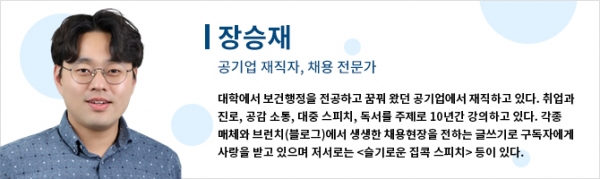
취업을 목표로 한 졸업생 혹은 예비 졸업생이 가장 먼저 취업 준비 스터디를 찾는다. 각자가 원하는 기업의 입사를 목표로 한 자리에 있으나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취업 준비생으로 거의 구성한다. 학생 위주이나 졸업한 소속 없는 ‘백수’도 있다.
그들은 합심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취업을 주제로 이것저것 소통한다. 정보의 원천은 인터넷 유명 카페, 유튜브, 취업 서적에서 나온다. 누구나 알 수 있고, 특이한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준의 속성을 띈다. 개성을 드러내야 할 면접장과 자기소개서에도 모범답안이 마치 있는 것처럼 토의한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고루한 답변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다.
스터디는 ‘끼리끼리’ 구성한다. 취업필패이자 장수생으로 가는 잘못된 길이다. 옳은 길은 진정성 있는 전문가나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조타수 역할을 한다. 혹은 합격한 현직자가 이끄는 배에 동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례가 사회에서 통할 수 있고 적합한지 분간하기 어렵다. 사례로 지원하는 본인을 증명한다. 판별하는 문은 이제 막 채용 시장에 입문하거나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는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구성이 어렵다면 서너 명이 모여 각자의 사례를 터놓고 말한다. ‘A’부터 ‘D’까지 사례를 풀어 놓아야 한다. 면접관의 관점이 되어보자. 과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중을 이끌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재미있고 다음 모임이 기대가 되는 친목도모 위주의 성격은 옳지 않다. 그건 당신이 입사 후에 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재미있다.
다음 과정으론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충분하고 어색하지 않다면 나를 찍는 동영상 촬영을 시도한다. 수시로 살펴보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나날이 반복되는 일상이 약약하게만 느껴진다. 아침에 깨어있을 때나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생각에 맴돈다. 그럼 하산하여도 된다. 이런 복선은 최종 합격의 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