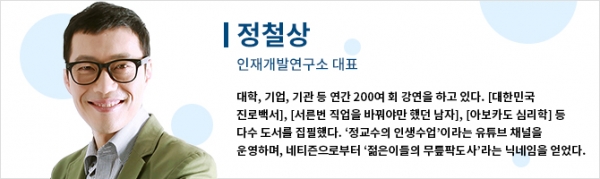
직장인이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려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특화할 만한 요소를 찾아 그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걸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자기 일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일하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겠다.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질문을 던져도 하나의 메시지로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문헌들을 살펴보면 일은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의 저주이기도 하고,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다고 나와 있다. 이렇듯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펼쳐지는 이유는 뭘까.
영어에서 ‘일’을 뜻하는 단어 ‘work’는 ‘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 실행하는 것, 행위, 조처, 업무, 행해지는 것 혹은 이미 행해진 어떤 것, 어떤 사람이 행하거나 이미 행한 것’라고 정의되어 있다. 어원은 10세기 고대 영어의 명사 ‘위르크(woerc)’와 동사 ‘위르칸(wyrcan)’에서 파생됐다. 말하자면 ‘일’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라 할 수 있고, ‘일’이라는 단어는 인간 활동에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성인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개인적인 일’과 '사회적인 일’로 구분하게 된다. 개인적인 일은 ‘즐기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사회적인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형벌’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지옥에서 시시포스를 만난다. 시시포스는 제우스를 속인 죄로 지옥에 떨어져 커다란 바위를 쉬지 않고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저주에 걸려 있다. 바위는 산꼭대기에 이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그는 바위를 다시 산꼭대기로 밀어올린다. 이 과정을 영원히 되풀이해야 한다.
이 이야기에 대해 《일의 발견》의 저자 조안 B. 시울라는 시시포스를 괴롭힌 원인을 3가지로 꼽았다. ‘소모적이고 지루한 과업’, ‘자유 상실’,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 그것이다. 알베르 카뮈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신들이 쓸모없고 헛된 노동보다 더 무시무시한 형벌은 없다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평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 역시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각자의 직업 생활을 통해 ‘직무’와 ‘근로 활동’이라는 바위를 날마다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고 있는 듯하다. 이유도, 끝도 모르는 채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참담함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다들 바빠 보이지만, 고민을 잔뜩 안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딘가를 향해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다.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산업 구조상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아질 방법은 있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일에서 ‘보다 의미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일에서조차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