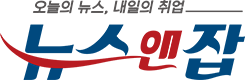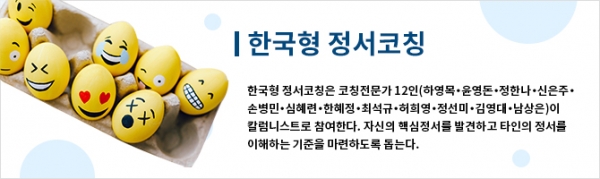
정서와 감정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감정과 정서는 유사하지만 구별된다.
카를 융(Carl G. Jung)에 따르면, ‘감정(feeling)’은 판단기능으로 확실한 신체 반응을 동반하지 않으나, ‘정서(emotion)’는 감정에 신체 반응을 동반한다고 여긴다.
어원을 보더라도 ‘이모션(e+motion)’은 ‘e(ex=out)’와 ‘motion’이 결합하여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불쾌한 느낌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언어로 표출될 때 얼굴에 울긋불긋 신체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서’가 된다.
뇌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 에 따르면, 감정이 “자극에 대한 지각과 이어서 나타나는 감정상태와 사고의 복합체”라면, 정서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어떤 신체적 반응”이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자극에 대한 인지적 기능이라면, 정서는 인지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동반한다.
감정(感情)이 어떠한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라면, 정서(情緖)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희로애락(喜怒哀樂)과 같이 본능적 표출로 나타난다. 감정은 사람의 의지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정서는 무의식적 속성 때문에 잘 조절되지 않는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실제로 분노가 일어난다.
감정이 내 마음에 작은 파문처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면, 정서는 강한 파도처럼 경험할 때 일어나는 갖가지 기분이다. 감정은 날씨처럼 하루하루 상태가 바뀌지만, 정서는 뿌리 깊은 마음의 터전이다. 감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리에 대한 반응이라면, 정서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몸의 기억이다.
당신은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 제임스-랑게의 정서 이론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감정이 신체 변화를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반대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제임스-랑게의 정서 이론(James-Lange theory of emotion)’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1884년에, 덴마크의 카를 게오르크 랑게(Carl Georg Lange)는 1885년에 거의 동시에 제창했기 때문이다.
정서경험은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을 지각한 결과로 생긴다는 이론으로, 자극 → 정서 → 신체적 변화의 순서가 아니라 자극 → 신체적 변화 → 정서의 순서라고 주장한다. 제임스와 랑게는 무서움의 정서는 심장이 빨리 뛰고, 소름이 돋는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면서 생기는 것이라 했다. 정서반응의 1단계는 정서자극을 지각하고, 2단계는 지각이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며, 3단계는 신체적 변화가 뇌로 전달되어 정서를 경험한다.
우는 동시에 슬프다: 캐논-바드 정서 이론
1927년 생리학자 월터 브래드포드 캐논(Walter Bradford Cannon)과 그의 제자 필립 바드(Philip Bard)는 제임스-랑게의 이론을 강력하게 반박하며 정서자극이 자율신경계의 활동과 뇌의 정서경험을 동시에 일으킨다고 보는 이론을 만들었다.
‘캐논-바드 정서 이론(Cannon-Bard theory of emotion)’은 고양이의 교감 신경을 모두 제거하는 충격적인 실험을 했더니 교감신경이 없는데도 똑같은 감정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 변화와 정서의 경험은 동시에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이론을 제안했다.
심리학자였던 제임스와 달리 생리학자였던 캐논은 자신의 이론을 지지하는 생리학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캐논과 바드는 시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정서와 신체 변화 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어 두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논-바드 정서 이론은 시상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뇌의 역할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는 이유를 알아서 슬프다: 이요인 정서 이론
생리적인 반응이 중심이 된 정서 이론이 전개되었다면, 1962년 샤흐터와 싱어는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요인 정서 이론(two factor theory of emotion)’ 을 발표한다.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릴 때 결혼해서 기뻐서 그러는지, 사람이 죽어서 슬퍼서 그러는지 알 수 없다. 이요인 이론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주사를 놓는 실험을 진행했다. 인간은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해석하면서 정서를 느낀다는 것이다. 먼저 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를 주어진 상황에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두려움의 정서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