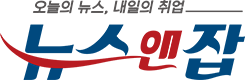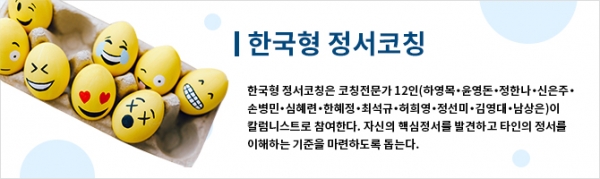
신경과학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전자기적 신호체계를 중요시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정서는 두 곳에서 처리된다.
하나는 변연계(limbic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의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이다.
이 둘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그것을 왜 이해해야 할까?
먼저 변연계를 살펴보자. 변연계란 라틴어로 ‘경계(shore)’를 뜻하는 림부스(limbus)에서 온 개념이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 변연계는 사고(cognition)를 담당하는 계와 정서(emotion)를 담당하는 계가 서로 만나는 경계영역이라는 뜻 이다.
이 (변연)계 안에는 여러 작은 영역이 정서적 감각(perception) 형성에 관여 하고 있다. 이들 전체를 설명하려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변연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3형제라 할 편도체와 해마, 시상까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편도체
편도체는 인체의 비상벨과 같다.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거쳐서 들어온 모든 감각정보는 편도체의 검열을 받는다. 비상 신호가 섞여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만약 응급상황이라 판단되면, 반사적으로 도망(flight)가게 하거나 대적(fight)하게 만든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두려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신호로 삼아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본능에 가까운)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아몬드 크기만한 이 기관의 특징은 죽기 직전까지 신경세포가 계속 생성되는 것인데,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퇴화를 원치 않는 기관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편도체가 손상되면 공포나 두려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못 느낀다. 그러한 정보를 공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해리엇 레너(Harriet Lerner)는 『Dance of Anger(분노의 춤)』에서 “정서에는 부정, 긍정이 없고 모두 신호다” 라고 해석한다.
해마
해마는 정서적 기억을 담당한다.
‘해마’라는 이름은 이 기관의 모양이 마치 바다에 사는 해마와 유사해서다.
해마가 담당하는 기억기능은 기능성 자기공명장치(fMRI)가 개발된 1990년까지만 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해마는 좌・우뇌의 측두엽에 하나씩 존재하는데, 크기가 3~3.5cm 에 불과하다. 대뇌피질의 1/100도 안 되는 작은 곳에 정서적 기억 전체가 저장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마가 정서를 기억하는 원리는 정서적 연결고리만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을 퀸즐랜드 두뇌연구소(Queensland Brain Institute)에서는 ‘인덱싱(indexing) 기능’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좌측 해마는 최근의 연결고리를, 우측 해마는 일생 동안의 연결고리를 기억한다.
왜 그것을 기억 할까? 바로 자신의 생존과 연관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판단할까? 두뇌의 여러 영역에 분산 저장된 정보들을 정서기억으로 끌어와서 편도체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정서개발의 본질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서개발 항목에서 다루겠다.
시상
시상은 두뇌의 중심에 위치한 여러 개의 핵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시상의 기능은 감각정보의 물류기지 같은 것인데, 이곳을 통하지 않고는 (후각을 제외한) 어떤 정보도 대뇌피질로 전달되지 않는다.
시상을 거친 정보는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시상하부(hippothalamus)를 통해 자율신경계와 연결된다.
자율신경계의 기능은 아래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충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시상이 하는 정서적 기능만 정리하겠다.
시상이 하는 역할은 물류 터미널 성격이라 했는데, 더욱 중요한 기능은 체온관리와 호흡, 호르몬 분비조절 같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관리한다.
그 의미는 체온과 호흡, 호르몬 분비 같은 생리적 정서반응이 시상의 자율조정기능에 따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서적 성숙은 이런 불수의적인 시스템의 항상성(homeostasis)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