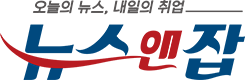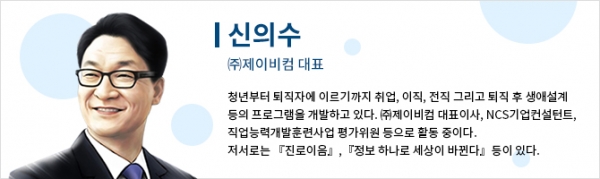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웹상에서 글이나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명시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통해서다.
이후 2007년 7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전격 시행되었다. 200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 웹사이트로 몰리는 등의 이유로 2012년 8월 23일 위헌으로 결정났다.
부동산실명제는 1995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더라도 남의 명의로 등기하면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는 등기를 남의 명의로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명의신탁의 금지를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다양한 현대의 실명제는 단순히 떳떳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익명성의 발로로 신뢰를 구축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안타깝다.
선조들에게 있어서 실명제가 가지는 의의와 목적은 직업적 활동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 태도 등에 대한 자부심과 또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직업윤리 측면에서 명문화 한 것이다.
현대의 실명제 논의는 책임회피와 익명성 등 부정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세태에 직업윤리는 설 자리조차 찾기 어렵다.
입시에 밀려 학교에서부터 직업윤리 교육이 실종된 지 오래이며 그런 상황에서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직업인으로 키워지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
선조들의 역사, 유물 속 실명제에서 직업적 윤리에 대한 가치를 배우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이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