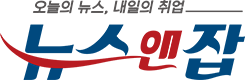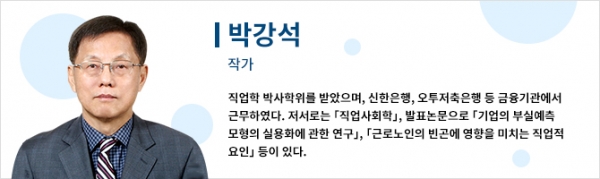
재능 있는 아이를 해안으로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직업생애를 논의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으므로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로 안내하여 이것저것을 해보게 만든다. 그 다음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영재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 결국 좋아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70이 넘어 노벨화학상을 받은 수상자는 어려서는 화학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화학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될지는 더욱 몰랐을 것이다. 어려서 수학을 남달리 좋아하여 어려운 문제도 곧잘 풀고, 무엇을 보면 그 작동원리에 관심이 많고았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죄다 분해하여 망가뜨리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를 눈여겨 본 선생님이 대학진학을 앞둔 이 학생에게 화학 분야라는 해변으로 인도를 한 것이다.
과학 분야에 재능이 많았던 학생의 눈앞에 드디어 구체적인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된 것이다. 해변을 거닐면서 예쁜 조개를 찾아내고 정신없이 만져보고 뜯어보고 그러다가 이 조개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개를 가지고 평생을 보낸 것이다. 예쁜 조개는 뉴턴만 찾아낸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영재들이 각 분야에 고루 포진하여 평생을 아무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영재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이것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하는 일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도 아니다. 지금의 영재교육시스템을 고칠 것은 없는지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공부를 좀 한다 싶으면, 대부분의 부모는 의대나 법대로 진학하기를 바란다. 그놈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각 분야에 인제가 골고루 퍼지기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제도를 고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조인 양성방법이 고시에서 로스쿨제도로 바뀌니까 우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매달려 수년 동안 기약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제도가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대의 경우 의사의 소득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높지도 않게 하고 책임과 의무만을 무겁게 해놓으면 봉사와 희생정신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의대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재가 널리 분포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이 의대로 재 진학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산업부분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지만.
영재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영재에게 반드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있다. “너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 났으니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너는 네 부모를 먹여 살리는 일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명확한 동기와 목표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과 같은 것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는 평생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도록 국가가 지원에야 한다. 설사 무슨 업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후술하는 직업전장에서 적군 편에 서는 병사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영재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젊은이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 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이 시작은 취업이다. 그 다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우선 직장에서 찾아내도록 권유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직업사회를 어떻게든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앞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특성을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기로 하자. 그것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훈련된 학생들이 갑자기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또 바꾸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